* 이 글은 '주간 유정식' 88호 경영수필에 실린 글입니다.
* '주간 유정식'을 정기구독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중고등학생 때, 내가 음악을 듣고 있노라면 어른들이 지나가며 이렇게 한 소리씩 하곤 했다.
“너는 애늙은이도 아니고, 이런 음악을 듣냐? 젊은 애들 노래 안 듣고.”
그때 내가 들었던 음악은 당시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소방차, 전영록, 박남정, 김범룡, 이지연 등의 노래가 아니었다. 몇 년 전에 타계한 조동진의 음악이었다. 그의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른들이 왜 내게 애늙은이 같다고 했는지 단박에 이해할 것이다.
‘겨울비’, ‘나뭇잎 사이로’, ‘차나 한잔 마시지’ 같은 그의 노래 어디에도 빠른 비트나 복잡한 악기 구성은 찾아볼 수 없다. 담백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 읊조리는 듯한 중저음의 목소리를 듣노라면 심박수가 줄어드는 듯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다. 간혹 감상이 지나쳐 멜랑꼴리해지기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형성된 우울감을 꽤 즐겼다. 가사 속의 남자라면 나는 어떤 기분일지, 그 남자가 바라보는 바다는 어떤 빛으로 가득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가 맞는 겨울비의 촉감은 어떨지, 어두운 벌판을 달리다 한가운데 우뚝서서 올려다 본 하늘엔 별이 가득하겠지 등을 상상하는 시간은 내게 소소한 즐거움이기도 했다. 나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했다.
그렇다고 유행하는 노래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워낙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통에 안 들을 수가 없었고 제목이나 멜로디 정도는 들으면 아는 수준이었다. 친구들은 왜 이런 음악을 좋아할까 의아해 하며 일부러 찾아 들어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왜 이리 빠르고 복잡한 음악을 즐길까? 속 시끄럽게시리…’라며 카세트 데크를 끄곤 했다. 반 친구들이 쉬는시간마다 그 시절의 ‘인싸템’인 ‘마이마이’나 ‘요요’, ‘아하’ 따위의 포터블 카세틏ㄱ를 꺼내들고 흥얼거리다가 내게 한번 들어보라고 이어폰 한쪽을 내 귀에 꽂으면 그때마다 싫은 티를 팍팍냈다. “야, 너나 들어!”라고. 나는 인싸템 없는 아싸였다.
고등학교 시절, 곱상하게 생겨 가지고 내 뒷자리에 앉아 매일 유행가를 흥얼거리던 녀석이 있었는데, 노래를 곧잘 하는 편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 취향이 아닌 노래를 연신 부르니 자습에 방해가 되었다. 뒤를 홱 돌아보며 “야, 노래 좀 그만해!”라고 소리를 지르면, 녀석은 용용 죽겠지, 하는 입술로 ‘어디 한번 내 입을 막아보시지.’라며 그 잘난 노래를 이어가곤 했다. 군대를 제대할 쯤 보니까 그 녀석은 듀엣 ‘녹색지대’의 멤버가 되어 인기가수의 반열에 올랐다. 그렇게 짜증을 유발할 정도로 노래를 불러대더니 그 재능을 살리는구나, 싶었다. 지금은 미사리 어느 카페의 단골 초대가수가 된 것 같아 좀 안쓰럽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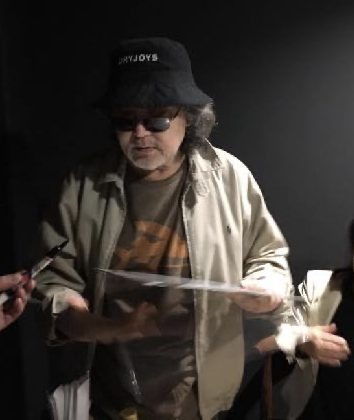
템포가 느리고 멜로디가 단순하며 악기 구성이 단촐하고 서정적인 노래를 좋아하는 취향은 사회인이 되어서도 이어졌고, ‘조동진 류’의 언더그라운드 가수(당시엔 인디 가수를 이렇게 불렀다)들의 노래에 심취했다. 대중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으려는 반골 기질도 한몫했지 싶다. 서태지, R.E.F, 핑클, S.E.S 같은 댄스가수들의 비트 빠른 음악은 여전히 내 취향이 아니었고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나온다 싶으면 다이얼을 돌리곤 했다. 마치 못들어줄 소음을 들었다는 듯.
그러던 내가 요즘엔 비트가 강하고 빠르며 휘몰아치는 듯 질러대는 음악을 일부러 찾아 듣고 있으니 나조차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만약 클레어 로진크란츠(Claire Rosinkranz), 두아 리파(Dua Lipa), 베니(BENEE),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lish), 멘 아이 트러스트(Men I Trust) 등의 노래를 즐겨 듣는 나를 누군가가 목격한다면, 내가 청소년 시기를 조동진 노래와 함께 했음을 상상조차 못하지 싶다. 물론 내 음악적 성향의 주류는 여전히 조동진 쪽에 가깝지만, 예전보다는 클레어 로진크란츠 쪽으로 무척이나 ‘우경화’되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따져보니, 제대로 된 오디오 시스템을 구비하고 헤드폰이나 이어폰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전에는 아이폰에 번들로 딸려온 이어폰을 노트북PC에 꽂아 듣거나 조악한 소형 스피커로 백그라운드 뮤직을 틀어놓는 게 전부였다. 최고급 하이파이는 아니지만 새 오디오가 들려주는 소리는 나에게 신세계였다. 10년 묵은 귓밥을 말끔히 파낸 느낌이라고 할까?
싸구려 스피커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악기의 디테일이 느껴졌고, 예전에는 꽝꽝 찌그러지는 듯한 소리로만 들리던 드럼킥은 쩍쩍하는 소리로 찰지게 들리는 게 아닌가! 가수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지만 귀를 엄청 피곤하게 하는 소위 ‘치찰음’은 새 오디오와 새 헤드폰에서는 부드럽기만 했다. 악기 편성이 많은 음악은 안 좋은 기계로는 뭉치고 떡진 소리를 내지만, 나의 하이파이 시스템에서는 4K 영상을 보듯 해상도와 악기 분리도가 뛰어나서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았다. 이게 재미있어서 템포 빠르고 다이내믹이 강하며 폭발적인 노래를 즐기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 도구가 좋아졌기에 그랬던 것이다.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우리집이 거실에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멋지게 장식해 놓을 만큼 좀 사는 집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여느 청소년처럼 박남정이나 소방차의 노래를 즐겼을까? 음악 취향이 우경화된 지금 생각해 보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지 싶다. 어쩌면 내가 조동진 류의 노래에 심취했던 것은 기질탓이 크지만 집에 있는 음악 청취 도구라고는 모노 카세트 레코더 하나 밖에 없었던 형편도 한몫했으리라. 그마저도 안테나가 떨어져 나가 주파수를 맞추려면 안테나 있던 자리에 옹색하게 스테플러를 세워 놓아야 했다. 식구들이 자는 시간이면, 스테레오는 언감생심, 한쪽 밖에 없는 산업용 이어폰으로 들어야 했던 ‘모노 청소년’이었다.

취향에도 범위가 있고 지평이 있다. 그리고 그 범위와 지평은 상당 부분 취향 즐기기를 돕는 도구가 좌우한다. 도구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스펙으로 취향의 경계가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도구를 더 나은 것으로 바꾸거나 아예 차별적인 것으로 바꾸면 현재의 취향 한계선이 풀리고 취향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 조동진 족의 땅에서 클레어 로진크란츠 족의 땅으로 취향의 경계선을 넓혔듯이 말이다.
충실한 도구가 당신의 취향을 충실하게 만든다. 때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법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싼 도구를 사들이라는 말은 아니니 오해 말기를 바란다. 싸구려 도구로 본인의 훌륭한 취향을 옥죄지 말라는 뜻이다. 어떤 취향이든 해당 카테고리에서 싸구려에 속한 도구로 만족하고 있다면 다른 데 쓸 돈을 끌어오더라도 미들급 도구까지는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그 후에는 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기억하라. 당신의 취향에는 그렇게 해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로, 장바구니에 새 오디오를 담아본다. 내 취향에 신선한 물과 비료를 줄 때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허락보다 용서가 빠르다고 하지 않는가! 등짝 스매싱 몇 대 맞고 당신의 취향을 살려라. (끝)
'[연재] 시리즈 > 경영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웬일이니 파리똥' 그리고 '날리면' (0) | 2022.09.27 |
|---|---|
| 5년의 시간을 치열하게 인내하는 법 (0) | 2022.03.15 |
| 페이스북이 온라인 교육 사업에 뛰어 들다 (0) | 2018.11.16 |
| 평창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65조원은 과연 옳은가? (0) | 2018.01.22 |
| 양껏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과학적 방법 (0) | 2017.12.04 |







